
건전한 육체(肉體)는 정신(精神)을 더욱 건전하게 한다.
정신(精神)이야말로 건전한 육체(肉體)의 밑거름이 된다.
그래서 동의보감(東醫寶鑑)에서도 인체에 가장 필요한 세 보물로 정(精), 기(氣), 신(神)을 들고 있다.
그리고 우리말에도 ‘정신(精神)이 나가다.’, ‘넋이 빠지다.’하여 정신(精神), 넋이 건전치 못하면 육체적으로도 얼마나 건전치 못한 증상들이 나타나는지를 여실히 표현하고 있다.
‘간이 콩알만 하다.’, ‘쓸개 빼진 놈’, ‘심보 사납다.’, ‘비위 거스른다.’, ‘허파에 바람 든다.’하는 말로써 육체적 여러 증상들이 모두 정신(精神)의 건전성이나 불건전성에 의해 좌우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여기고 있을 정도이다.
한의학(韓醫學)에서는 기쁨, 노여움, 슬픔, 공포 등 일곱 가지 정서적 변화가 육체적 병증을 일으킨다고 여기고 있다.
이것을 칠정(七情)에 의한 질병(疾病)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화병(火病)도 칠정(七情)에 의한 질병(疾病)이요, 문화관련 증후군이라 할 수 있다.
화병(火病)이 생기면 몸에 열기(熱氣)가 난다.
목가슴에 덩어리가 맺혀 삼켜지지도 뱉어지지도 않고 가슴이 답답해지며 가슴 속의 치밀어 오름이 심해진다.
‘정신이 없다.’는 하소연을 한다.
이런 증상들은 속상함, 억울함, 분함, 화남, 증오, 절망 등의 감정 반응에서 비롯한 칠정(七情)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이다.
우울(憂鬱)이나 불안(不安)도 이런 병(病)의 복합 형태의 하나로 나타나는 것이다.
불안(不安)만 하더라도 얼마나 커다란 육체적 피폐를 야기하는지 놀랄만하다.

불안(不安)은 초자아(超自我)로부터의 욕구들과 현실 원칙을 따르는 자아(自我) 그리고 사회적 제약 사이의 갈등에서 비롯되면서 육체(肉體)를 놀랍도록 피폐하게 만든다.
그러면서도 우리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이 불안(不安)이다.
이별의 불안(不安)에서부터 자기 징벌적 죄책감에 의한 불안(不安)까지 다양하다.
이걸 선택해도, 저걸 선택해도 모두 부정적 결과만이 나타날 것이 뻔한 상황에 처했을 때도 불안(不安)해지기 마련이다.
다행히 자아(自我)가 건전하여 방어기제가 제대로 작동하면 불안(不安)은 사라지지만, 자아(自我)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불균형이 계속되고 만성 불안(不安)이 나타난다.
우리가 친숙하지 않은 환경이나 상황이 계속된다면 위험과 고통이 예기되어 더욱 불안(不安)은 고조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슴이 두근대고 동공(瞳孔)은 커다랗게 열리며 위장(胃腸)운동이 변화하고 호흡(呼吸)은 증가하며 혈압(血壓)은 상승한다.
소변(小便)이 잦아지고 설사(泄瀉)를 하거나 머리털이 곤두서고 식욕(食慾)이 떨어지고 불면증(不眠症)이 나타난다.
행동도 과민해지고 서성대고 안절부절 못하게 된다.
심리적 평형 상태를 위협하는 생각이나 충동에 대한 위험신호로 이런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때로는 공황장애(恐惶障礙)를 일으켜 갑자기 공포심(恐怖心)이 극도로 심해지면서 심장(心臟)이 터져버릴 것 같은 극단적인 불안(不安) 증세를 보이면서, 때로는 광장공포증(廣場恐怖症)을 일으켜 혼자 있지를 못하고 두려워하거나 외출할 때 누구와 꼭 동행하려고 하는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질식감, 휘청거리는 느낌, 자기나 주위가 달라진 것 같은 비현실감, 손발이 저리는 감각 이상이나 몸의 떨림, 때로는 돌발적인 열감(熱感)이나 냉감(冷感), 땀 흘림 등이 나타나고 동시에 실신(失神)하거나 죽거나 또는 미치거나 하는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공포(恐怖) 등이 엄습한다.
심해지면 과호흡(過呼吸)으로 인해 입술까지 새파래지는 신체 증상도 나타난다.
부부(夫婦)간에 불화(不和)가 심화되기도 하고 직장이나 학교가기를 거부하기도 한다.
얼굴이 벌겋게 되어 말을 못하고 음식 먹기조차 두려워하기도 한다.
강박적 사고나 강박적 행동에 빠져 스스로 이를 합리적인 것이라고 여기면서도 되풀이 안하면 더욱 불안(不安)해 견디지 못한다.

악몽(惡夢), 집중곤란(集中困難), 흥미상실(興味喪失), 모든 것에 대한 무관심(無關心)을 비롯해 짜증, 놀람 등의 증상도 일어나며 때로는 갑작스런 충동적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사랑이란 느낌을 가질 수 없다고 하며 직업, 결혼, 자녀 또는 장수(長壽)에 대해 기대하지도 않는다.
다시 말해 감정 표현의 제한과 단축된 미래에 대한 감각을 보이는 것이다.
까닭에 육체적 건강(健康)을 위해서라도 정신적 건강(健康)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경험되는 감정의 변화에 너무 예민해서는 안 된다.
과거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한 때의 상황과 그 고통이 언젠가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예기(豫期) 불안(不安)에 스스로 빠져서는 안 된다.
과거는 지나간 것이요, 그와 똑같은 장소나 똑같은 상황은 다시 올 수 없기 때문에 건전한 정신(精神)을 갖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 사고를 해야 한다.
미래지향적 사고도 때로 불안(不安)을 야기한다.
그것은 내부 모순에서 출발하는 것이 많다.
그래서 이러한 모순에서 탈피해야 한다.
아울러 끝없는 인내(忍耐)와 투지(鬪志)를 키워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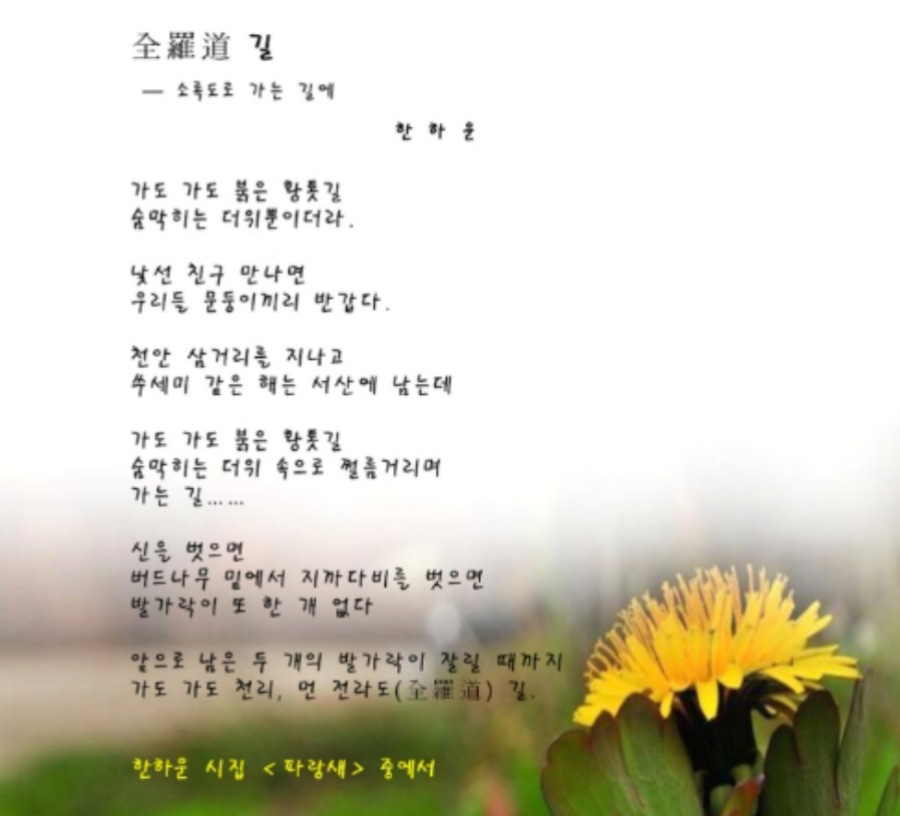
나병(癩病)환자였던 한하운(韓何雲)은 가도 가도 끝없는 황토길, 뙤약볕이 내리 쬐이는 전라도 길을 걸으면서 시(時)를 썼다.
‘버드나무 밑에서 지까다비를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다.’고 시(時)를 쓰면서, ‘앞으로 남은 두 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투병(鬪病)의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투지를 보이고 있다.
이런 투지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WHO에서 건강(健康)에 대해 정의 내리기를 ‘육체적으로 질병(疾病)이 없는 상태만을 건강(健康)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精神)적으로 건전하여 사회적으로도 원활해야 건강(健康)하다.’고 했다.
건전한 정신(精神)으로 사회적 유대를 맺으며 이웃을 사랑하고 다함께 어우러져 가는 삶을 사는 것이 건강(健康)의 길임을 알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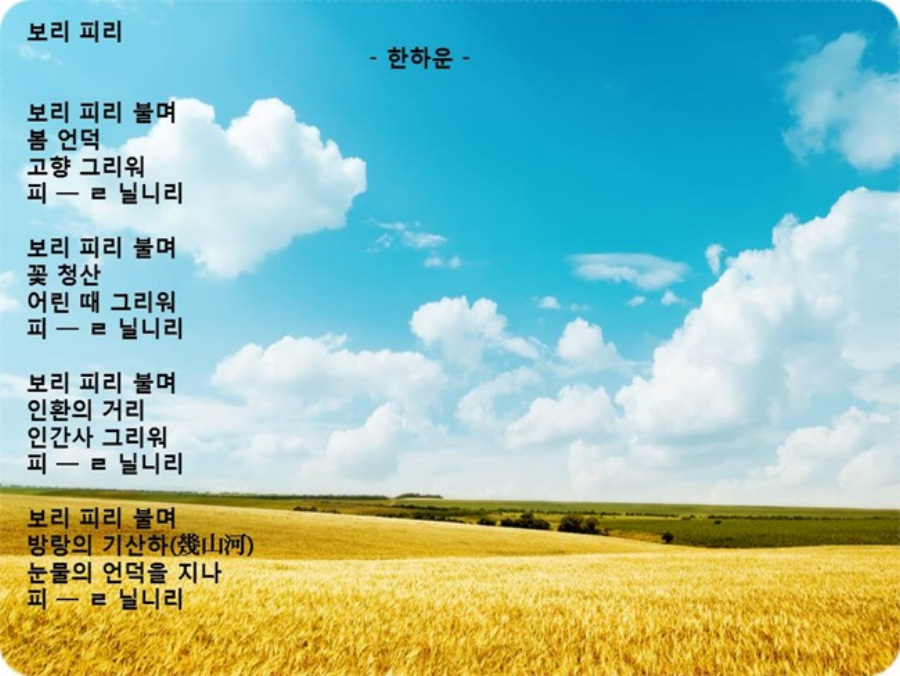
그러기 위해서는 나병(癩病)환자였던 한하운(韓何雲)의 시(時)를 한 번 더 읽어봐야 한다.
그는 보리 피리를 만들어 불면서 이런 시(時)를 썼다.
‘보리 피리 불며, 인환의 거리, 인간사 그리워, 피ㅡㄹ 닐니리’
설령 사람이 사는 인환(人寰)의 거리에 나가서 돌팔매를 맞고 막대기에 찔리면서 온갖 모욕과 멸시와 욕설을 듣는다 하더라도 ‘인간사 그리워’ 사람이 사는 거리에 나가겠노라고 했던 나병(癩病) 환자 한하운(韓何雲)처럼, 둘레와 어우러져 살아가려는 노력과 인식이 있어야 비로소 건전한 정신(精神)을 갖게 되는 것이요, 그런 건전한 정신(精神)을 지니고 있어야 비로소 육체적으로도 건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기가 만들어 낸 틀 속에서 스스로 빠져, 자기가 만들어 낸 불안에 떠는 불안신경증(不安神經症)으로 침착성을 잃고 죽음에 대한 공포(恐怖)에서 헤어나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다.
외적 상황이 개인적, 심리적 기제로 왜곡, 비대화하여 객관적 상황에 비하여 어울리지 않게 큰 위협이 되어 신경성 불안(不安)에 노심초사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이런 불안(不安)을 종교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다.
이토록 불안(不安)은 육체적 피폐를 엄청나게 야기한다.
건전하지 못한 정신(精神)이 얼마나 육체에 해(害)가 되고 육체를 파괴시키는가를 불안(不安)의 예로써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이다.
'한방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질병(疾病)의 원인은 세 가지 독소(毒素)에서 비롯된다. (3) | 2025.03.19 |
|---|---|
| 방귀 이야기 (2) | 2025.03.18 |
| 비오는 어제의 우산을 빨리 접는 용기가 필요하다. (3) | 2025.03.15 |
| 어려운 때일수록 고요함 속의 꿈틀거림이 있어야 한다. (3) | 2025.03.14 |
| 제왕절개(帝王切開) 수술은 난산(難産)의 비상수단일 뿐이다. (3) | 2025.03.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