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胃)는 양생(養生)의 근본, ‘···中湯’은 모두 건위약(健胃藥)

동의보감(東醫寶鑑)에 올라 있는 순서에 구애됨이 없이 단방(單方) 보약(補藥)을 한 가지씩 소개하여 왔는데 사실은 맨 첫 번째 약(藥)이 황정(黃精)이다.
뿐만 아니라 약물학편(藥物學編)인 탕액편(湯液編)에 초본(草本)에 속하는 약재(藥材)를 상하(上下)로 나누어 267종을 기재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황정(黃精)이 맨 처음에 나타난다.
우연히 그런가 하고 보면 그 순서가 황정(黃精), 창포(菖蒲), 인삼(人蔘), 천문동(天門冬) 등으로 되어 있어 모두 보약(補藥)에 속하는 것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 황정(黃精)을 인삼(人蔘)보다도 먼저 기재하고 있는 것을 우연이라고만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오래 먹으면 몸이 가벼워지고 얼굴이 좋아지며 늙지 않고 영양(營養) 상태가 좋아진다.”
“보중익기(補中益氣)하고 비위(脾胃)를 이롭게 하며 일명 선인반(仙人飯)이라고도 한다.”

현대의학에서도 병(病)의 원인을 따지는 병인론(病因論)이 중요하듯이 한의학(韓醫學)에도 여러 가지 병인설(病因說)이 있는 가운데 위장(胃腸)의 소화(消化) 기능이 나빠지는 것이 모든 병(病)의 원인이 되므로 위장(胃腸)을 튼튼히 하여 전신(全身)의 영양(營養)상태를 좋게 해 주면 만병(萬病)을 고칠 수 있다는 학설이 원(元)나라 때 이동원(李東垣)이라는 사람에 의하여 주장되었다.
동의보감(東醫寶鑑)의 여기저기에 위장(胃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병(病) 치료 또는 양생(養生)의 근본은 위장(胃腸)을 튼튼하게 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대목이 많은 것을 보면 허준(許浚) 선생도 같은 사상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방(韓方)에서 위장(胃腸)이 전신(全身)의 중앙부(中央部)에 위치하고 있다 하여 중(中)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위장(胃腸)이 생명 영위의 중심이 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한약(韓藥) 처방 중에는 ‘중(中)’자 붙는 것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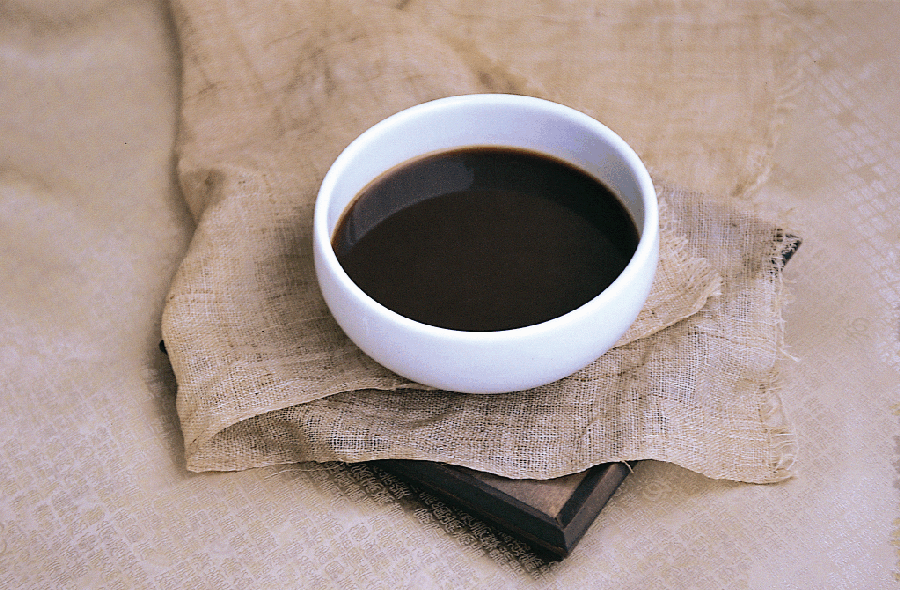
예컨대 이중탕(理中湯), 소건중탕(小建中湯), 대건중탕(大建中湯), 당귀건중탕(當歸建中湯),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 등은 모두 소화(消化) 기능을 좋게 하는 약물이라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황정(黃精)의 약효를 말하는 가운데 보중익기(補中益氣)라는 것도 “위장(胃腸)을 튼튼하게 하여 기운(氣運)을 돕는다.”는 뜻이 될 것이 아닌가?
소화기(消化器)를 표현하는 비위(脾胃)의 비(脾)는 오늘날의 해부학적 비장(脾臟)을 그대로 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비(脾)가 소화(消化)기능을 관장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비(脾)를 보(補)하는 것이 건강(健康)의 비결이며 비(脾)는 오행설(五行說)의 토(土)에 해당되므로 위장(胃腸)을 튼튼히 하는 것이 만사의 근원이 된다는 이동원(李東垣) 학파를 보토파(補土派)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데 재미나는 일은 황색(黃色)은 오행설(五行說)의 토(土)에 해당되는데 만물을 육성하는 흙이 누런색이니 달걀 노른자위, 대두(大豆) 등에 영양 가치가 높은 것도 황색(黃色)이기 때문이며 황정(黃精)도 그래서 보약(補藥)이 된다는 것이다.